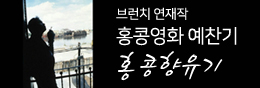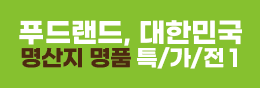‘Dr. Park의 교육 칼럼’에서는 20년 이상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일해왔던 필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또는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는 물론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특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홍콩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학습 현장의 에피소드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홍콩시험평가국이 다가오는 2025년부터 홍콩의 대학입학능력시험(DSE)에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어교육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나로서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는 홍콩 사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뚜렷한 지표이다. 택시를 탔을 때 또는 식당을 가거나 쇼핑을 할 때 내가 한국인인 것을 알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며 건네 오는 홍콩 사람들의 짤막한 한국어 인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그들의 관심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물론 나도 그들에게 “음꺼이사이(唔該晒)”라고 답한다. 이는 그들과 나의 문화적 존중이자 소통의 작은 표현이다.
 출처: HKEAA
출처: HKEAA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소통도 이러할진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 구성원 사이의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외국 생활 16년 중 홍콩 생활 12년 차인 나와 남편은 딤섬을 무척 좋아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라면에 김치를 먹으면서 그 후유증을 달래야 하는 사람들이다. 온 몸의 촉수가 한국을 향해 뻗어 있는 우리 부부는 더 많은 기회,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어가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잘 알기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애써 왔다.
2006년부터 시작한 중국 생활. 큰아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의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바로 현지 로컬 학교 3학년에 편입이 되었다. 아이는 자기 이름 석자도 한자로 쓸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흔한 ‘니하오’ 인사도 모른 채 현지인 친구들을 사귀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당시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던 터라 아이는 금세 급우들과 놀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작게는 필통 속 문구류에서 시작해 소풍날에 가지고 갔던 김밥은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을 정도였다.
학습 속도 또한 빨랐다. 성인 학습자보다 몇 배는 빠른 아이의 적응 및 성장 속도를 보면서 역시 외국어는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함을 절감했다. 내가 발음할 때는 못 알아듣는데 아이가 말하면 현지인들이 척척 알아들으니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할 때도 우리 가족은 아이에게 점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어디를 가든 엄마 아빠의 입과 귀가 되었다. 친척들이 오면 모시고 나가서 통역도 해야 했다. 반면에 행여 가족이 의도하는 바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으면 가족들은 아이에게 실망하는 기색을 나타내며 아이의 자존심을 건들기도 했다.
사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아이만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니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또 자라온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 또래 집단에서 배제되는 쓰라린 경험도 했다. 교과 과정을 쫓아가기도 버거운데 귀가해서는 부모의 도움없이 학교 숙제를 해야 했고, 크고 작은 테스트 또한 혼자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인가 아이의 이부자리가 흥건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간 아이가 겪었을 스트레스의 정도를 비로소 짐작하며 아이를 말없이 꼬옥 안아주었다. 외국어교육의 중요성만 생각했지 아이의 심리적 상태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한글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다. 학교 생활도 재미있고 학교 친구들도 좋지만 자기의 감정을 보다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했다. 보통은 부모가 자식들의 모국어교육을 위해 아이들을 한글학교에 보내건만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한글학교에 가겠다고 자청했다.
토요일의 한글학교는 마치 축제 같았다. 각기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모여 일주일 동안 미뤄놓았던 이야기들을 펼쳐 놓는다. 친척들이 한국에서 보낸 선물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놀러갈 궁리들도 한다. 비록 금요일 저녁에는 밀린 일기 숙제를 한꺼번에 쓰느라 난리가 나지만 거짓말 조금 보탠 소재거리를 제공하는 일도 아이와 공유하는 재미 중 하나였다.
아이는 꼬박 2년 동안 한글학교를 다녔다. 그 기간 동안 말하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보여주었지만, 가장 큰 성과는 한국적 정서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 역사나 사회에 대한 지식 습득은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초성만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코드는 잃지 않았던 것이다. 며칠 전 칼럼 원고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싶어 아이에게 한글학교 수학 경험에 대해서 물었다. 아이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엄청 도움이 됐지. 그때 다녔던 2년 경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

한국에서 2년 반, 중국에서 4년, 홍콩에서 10년의 정규 교육을 받은 아이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 인재’ 축에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적 정서를 갖고 부모와 공감대를 이어가는 글로벌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린 나이에 스스로 한글학교를 선택하고, 꼭 필요한 시기에 재미있게 다녀준 아이에게 새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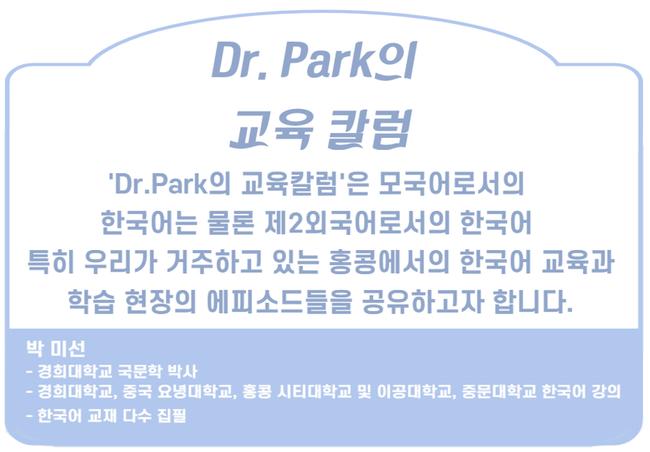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