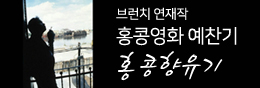- [제53호] 떼지어 몰려다니는 아이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아이들은 저마다의 소그룹을 만들어 학교에 다녔습니다. &n..
[제53호]
떼지어 몰려다니는 아이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아이들은 저마다의 소그룹을 만들어 학교에 다녔습니다. 등하교길이 재미있어지긴 했지만 가끔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엄마 : 얘, 너희들 왜 그러고들 있니? 모였으면 학교에
빨리 가야지!
우리 : (주눅든 목소리로) 한 명이 아직 안와서요
엄마 : 그럼 천천히들 가고 있어, 그 애 오면 빨리 따라
가라고 할 테니까, 어서 가!
우리 : 네에(아무도 움직이지 않음)
엄마 : (아이들이 움직일 때까지 염력을 이용해 노려본다)
우리 : (마지못해 골목을 빠져나가 숨어서 기다린다)
같은 시간에 약속을 해도 먼저 오는 아이가 있고 늦게 나타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는 아이는 지각하게 만드는 아이를 싫어하게 되고 정시에 시간 맞춰 나타나는 아이에게 늦게 오는 아이를 조직에서 제거해버리자고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엔 우리가 어른이 되면 누구를 따돌리고 말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멤버들의 입맛에 맞게 짜여진 그룹들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성적이 비슷한 아이들, 집안 환경이 비슷한 아이들, 집이 가까운 아이들, 성격이 비슷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녔습니다.
그런 조화로움 속에 눈에 거슬리는 옥에 티 같은 무리가 바로 제가 속했던 그룹이었습니다. 첼로를 배우는 친구, 키는 작아도 몸무게는 백 킬로에 가깝던 친구, 해마다 반장만 해먹는 친구, 날라리 지망생(필자 아님), 반장만 해먹는 친구 때문에 부반장만 해먹는 친구, 백일장만 나가면 상을 타오는 친구, 화가 아니면 화실 주인이 꿈인 친구, 젖소 목장 집 막내딸이던 친구 등. 아무리 찾아봐도 별 공통점이 없는데다 생김새까지 들쑥날쑥한 그들이 바위 같은 책가방에 첼로에 그림도구 등을 짊어지고 우르르 학교에 가는 모습은 '공포의 외인구단'만큼이나 괴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어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좀 비켜라 비켜, 이 뚱땡이들아, 이건 앞이 안보여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잖아! 밥들을 좀 덜 먹든지 말이야."
조용히 당하기만 하는 사람
자기를 학교까지 쫓아오는 변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넘도록 말 한마디 못하고 끙끙 앓고 당하기만 하던 친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합니다. 그날 교실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까지 그 친구는 변태가 쫓아오면 쫓아오는 대로 꼼짝 없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으면서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누구에겐가 말을 했다면 일주일이 넘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즉각 해결에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남에게 달려들어 도움부터 청하고 보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나름의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비명을 질렀다거나 아이들에게 좀더 일찍 얘기만 했어도 친구의 상황은 나아질 수 있었음에도 그녀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렇게까지 질기게 쫓아올까 싶어 버스를 탔지만 그것도 허사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길거리에서 지킬 수밖에 없었던 안전거리(?)를 무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 꼴이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굳어버린다든가 혹은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며 속으로 앓기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처럼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당했던 기억이나 철썩 같이 믿었던 상대가 도와주지 않았을 때 느낀 배신감 등으로 인해 도움을 청한다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마땅히 행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드는 당신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못 만나도 좋은 너
노출광에 얽힌 학창시절의 기억도 가물가물해진 몇 년 전, 한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세션을 마친 점심시간에 입맛도 없고 해서 아침에 들은 내용을 다시 훑어볼 겸 호텔 옆에 있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이란 장소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 가보는 곳이라 그런지 주변 경치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줄 때마다 바뀌는 새로운 경치 속에 항상 끼어있는 새롭지 않은 파란 물체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까부터 그와 똑같은 파란색이 줄곧 눈에 띄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 길래' 호기심어린 마음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파란 티셔츠를 입고 제게 옆모습을 보이며 서있던 노출광이 별안간 정면으로 돌아서 보이며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닙니까?
'타국에서 네 놈들을 만나게 될 줄이야'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던 말린 오징어를 스위스의 뒷골목에서 뜻밖에 마주쳤을 때와 비슷한 황당과 희한함이 뒤엉킨 기분. 그 파란셔츠가 무슨 궁중행렬 속의 무수리마냥 가만가만 보조를 맞춰 따라오는 것을 뒷눈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그때 그 친구를 이런 식으로 쫓아다녔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잔디밭에 둥그런 원모양으로 앉아 통기타를 치며 포크송을 부르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중국판 고교얄개 촬영현장이군.' 파란셔츠가 충실히 따라오는 가운데 조금씩 통기타 부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모르는 여자가 슬로우 모션으로 다가오자 불편해진 그들이 편치 않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낯 뜨거울 정도로 가까워지자마자 그들 옆에 철퍼덕 앉아서 파란셔츠를 향해 대뜸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 뒤돌아 볼 거 없어, 그래, 너 말야 너! 여기서 같이 놀자, 이리 와!" 이제껏 각도를 잘 맞춰서 자기를 가려주던 방패 같은 존재였던 제가 별안간 궤도에서 벗어나자 파란셔츠는 놀라움 때문인지 동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상태(?)를 본 남학생들이 화난 얼굴로 파란셔츠를 향해 달려가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부끄러움은 느꼈는지 파란셔츠를 밑으로 조금 잡아당긴 후에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원이란 공원은 죄다 우범지대라고 생각하는 저의 고정관념입니다.
라이프 코치 이한미 (2647 8703)
veronica@coaching-zone.com
www.coaching-zone.com
* 위클리홍콩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12-07 16:14)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모닝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28일 (토)
[모닝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28일 (토)
 홍콩한국국제학교 사회강사(시간제) 채용공고
홍콩한국국제학교 사회강사(시간제) 채용공고
 홍콩한인여성회 연말맞이 여성회 협력사 할인행사
홍콩한인여성회 연말맞이 여성회 협력사 할인행사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