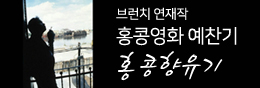[‘영문을 모르다’와 ‘퇴짜 맞다’의 어원 살펴보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영문을 모르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배우거나 경험하지 못해서 어떤 사실이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보통의 언중은 그 어원을 생각해 보지 않고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한 번쯤 그 어원을 생각해 본 사람이라도 아마 ‘영문(英文)’이 어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문 모를 어원인 ‘영문(營門)’의 어원을 함께 살펴볼까 한다.
‘영문을 모르다’의 어원을 밝히려면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영문은 조선 시대 감영의 문, 즉 영문(營門)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영문은 조선 시대 관청의 관리들 중 최고위직 관리들만 드나들 수 있던 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급 관리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조차도 영문이 언제 열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하고, 그러니 당연히 누가 물어봐도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영문을 모르다’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한다.
또한 어원의 유래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왔기 때문에 이 표현은 부정 표현인 ‘-모르다’와만 호응하는 독특한 호응 구조를 가지게 된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표현은 바로 ‘퇴짜 맞다’이다. 이 역시 ‘영문을 모르다’와 같이 독특한 환경에서만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인데, 주로 ‘퇴짜 놓다’ 혹은 ‘퇴짜 맞다’ 정도로만 사용된다. 여기에서 ‘퇴짜 놓다’의 경우 물건이나 의견 따위를 받지 않고 물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당연히 ‘퇴짜 맞다’는 퇴짜 놓임을 당한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이 된다.
여기에서 퇴짜는 ‘퇴(退)’라는 한자를 의미하며 이를 함께 적으면 퇴자(退字)가 되는데, 이 단어가 한자어 조어 법칙에 의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시옷 법칙이 적용되어 ‘퇴짜’로 경음화된 것이다. 이 단어의 어원 역시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봐야 한다.
조선 시대에는 ‘판적사’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이 관리가 하는 일이 바로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진상 및 공물 등을 일일이 확인한 뒤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명하는 일이었다. 판적사는 물건의 질이 낮아 도저히 조정으로 올려보낼 수 없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退’자를 찍어서 다시 물리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退’자를 찍는 행위를 ‘퇴짜를 놓다’라고 표현했으며, 진상한 물건이 ‘退’자가 찍혀 돌아오면 이를 가리켜 ‘퇴짜를 맞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자신들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데, 그 없는 살림에 공물이니 진상이니 하며 하도 쪼아대서 올렸더니, 그 물건이 다시 ‘퇴짜(退字)’를 맞고 돌아왔을 때 조선 시대 백성들이 느꼈을 허탈함과 막막함이 필자에게까지 밀려오는 듯하다.
오늘은 ‘영문을 모르다’와 ‘퇴짜 맞다’의 어원을 살펴봤다. 퇴짜야 회사를 다니면서 혹은 연애를 하면서 얼마든지 맞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퇴짜 맞을 때 그냥 맞지 않고 그 영문이라도 알고 맞을 수 있는 지혜(?)가 다들 생기셨길 기대해 본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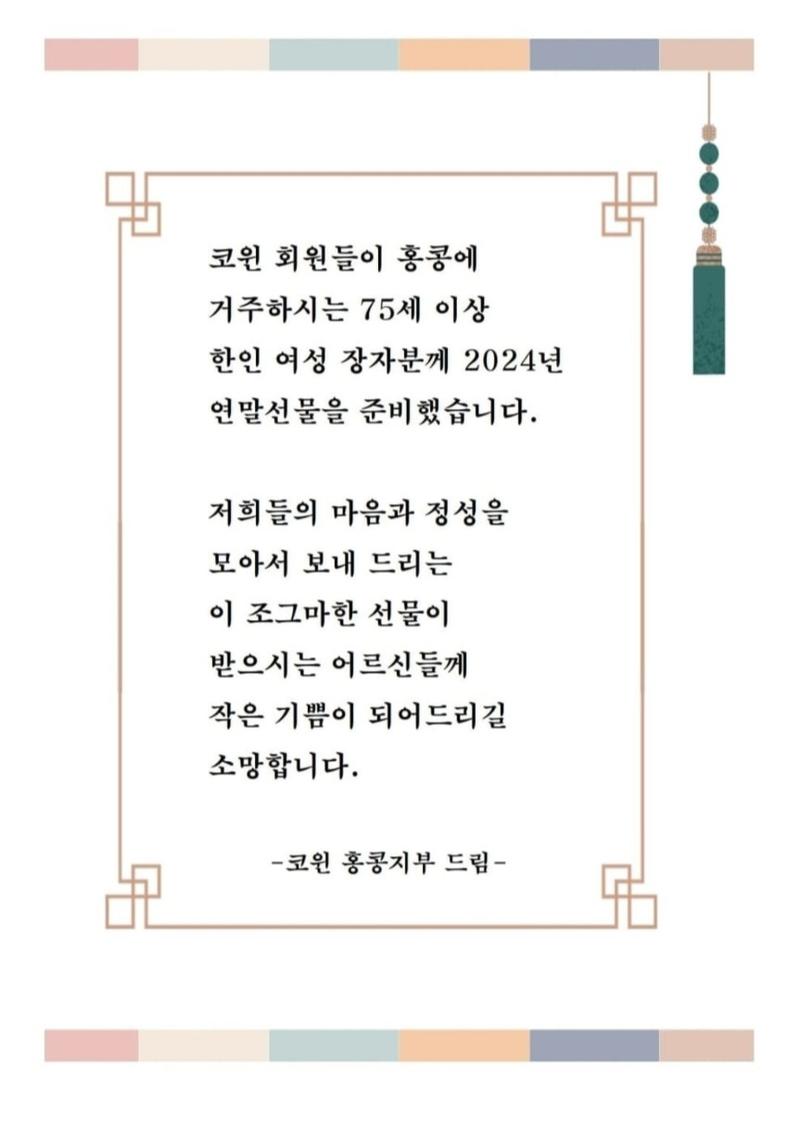 코윈 홍콩지부 한인 장자여성 대상 연말선물 배송
코윈 홍콩지부 한인 장자여성 대상 연말선물 배송
 [모닝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27일 (금)
[모닝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27일 (금)
 홍콩한국국제학교 사회강사(시간제) 채용공고
홍콩한국국제학교 사회강사(시간제) 채용공고
 홍콩한인여성회 연말맞이 여성회 협력사 할인행사
홍콩한인여성회 연말맞이 여성회 협력사 할인행사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