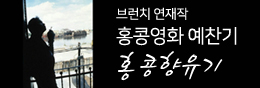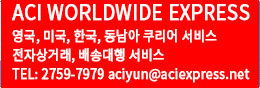고향의 향(香)윤혜영
어릴 적 우리 가족은 여름마다 충청도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을 방문하곤 했다. 그것도 할머니께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고 치매에 걸리신 후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만 있던 여름행사였다. 시골집에 가는 길은 어린 언니와 나에게는 너무나 길고 지루하고 괴로운 시간이었다. 지금처럼 차량의 에어컨 시설이 좋지도 않았고,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이 깨끗하지도 않았고, 가도 가도 끝없는 길을 가는 차 속에서 언니와 나는 크게 떠들면 시끄럽다고 아버지께 꾸지람을 들었다. 차 안의 답답한 공기가 너무 싫었던 나는 휴게실에서 한 번 내릴 때마다, 다시 차에 안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팔다리를 들린 체,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 차 안으로 다시 옮겨졌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몇 시간의 고역 끝에 도착해도 그게 끝은 아니었다. 비좁은 농촌의 도로로 들어가 할머니 집까지 가서 바퀴가 빠지지 않게 무사히 차를 주차해야 했고, 너무나 무섭고, 냄새 나고, 파리가 들끓는 재래식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 할머니가 주시는 요강에다 소변을 보는 것도,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창피하게 느껴져서, 언니나 엄마를 졸라 같이 화장실에 가달라고 사정해야 했다. 게다가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부엌 뒤에 있는 우물가에서 찬물에 샤워를 해야 했던 그 낯섦, 나는 어머니께 누가 쳐다보면 어떻게 하냐고 불안해하며 계속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무도 나 샤워하는 것에 관심 없으니 걱정 말라며, 찬물을 계속 끼얹어주셨다.
그렇다고 시골집에서의 여름휴가가 괴롭고 싫기만 했던 것은 분명 아니다. 시골집 마당에는 나무에 밧줄그네도 달려있었고, 언니와 나를 위해 할머니께서 미리 심어놓으신 듯한 봉숭아는 예쁘게 물들어질 우리들의 손톱, 발톱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골집에서 찍은 사진 속의 언니와 나는 둘 다 아주 새까맣게 그을린 상태로 모두 활짝 웃고 있다. 사랑채에 살고 있던 가족의 딸 소연이라는 아이도 나와 동갑내기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고, 아직은 벌레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동심이 있었던 나와 같이 메뚜기와 여치를 잡아주었다. 내가 어렸을 때도 지금처럼 식성이 좋았다면, 당연히 무공해의 신선하고, 향긋한 시골 반찬들도 분명 기억할 텐데, 그 시절의 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군것질거리만 좋아하던 철부지였기 때문에, 이제는 맛볼 수 없는 그 귀한 음식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댁을 방문한 것은 언제인지 정확히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언니가 수험생이라 바쁘다고 시골에 못 내려간다고 어머니가 언니와 같이 서울에 남아 있어야 했고, 할머니는 이미 서울에서 우리와 생활하고 계셨지만 치매로 여행을 하실 만큼 건강하신 상태는 아니었고, 아버지가 시골에 무슨 볼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나만 데리고 가신 것 같다. 그 때는 나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정말 따라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강요하여 하는 수 없이 끌려갔던 것이 분명하다. 너무나 오랜만에 간 시골집은 분명 그대로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었을 텐데, 할머니도 없고, 사랑채의 소연이 가족도 없는 시골집은 왜 이렇게 휑하고 낯설었는지, 아빠는 동네 어른들을 몇 분 만나 뵙고, 나는 혼자서 나무그네에 앉아 흔들흔들 시간을 때웠던 기억밖에 없다. 나는 그냥 언니가 수험생이라 같이 올 수 없어서 같이 투덜대고 떠들 상대가 없는 게 제일 괴로웠던 것 같다. 막상 같이 있으면 항상 원수처럼 싸웠으면서도 말이다.
정말 신기하게도 시골집에 처음 도착할 때에는 항상 쇠똥냄새인지, 비료냄새인지 알 수 없는 그 속히 '똥 냄새' 가 분명 강하게 났다. 하지만 도착하고 몇 시간, 아니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 똥 냄새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분명 냄새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가 그 냄새에 무뎌져 버리는 것이었겠지만 말이다. 서울에서 생활하다가도 가끔씩 그 똥 냄새 비슷한 비료냄새를 맡게 될 경우가 아주 가끔 있었다. 그러면 나의 언니는 "아 고향의 향이네~!" 하며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기하게 화단 같은 곳을 지나가다 비료냄새를 맡으면 나는 언니가 하는 말투의 "아, 고향의 향!" 하는 말소리를 떠올린다. 분명 그 시골집은 나의 아버지의 고향이지 나의 고향이라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고, 솔직히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나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친숙하지가 않다. 하지만 그 고약한 냄새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짠하게 떠올려지는 시골집은 아마 내 고향도 맞는 것일까.
시골집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를 들었던 것은 아마 내가 중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혼자 다녀 오신 후, 폐가처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완전 망가져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시골집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꺼낸 적이 없고, 나도 아버지께 여쭤본 적이 없다. 그런데 만약 아직도 그 시골집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며 대문에 서 계신 할머니가 계시다면, 우리 집 아이들과 함께 가서 그 어떤 여름휴가 보다 더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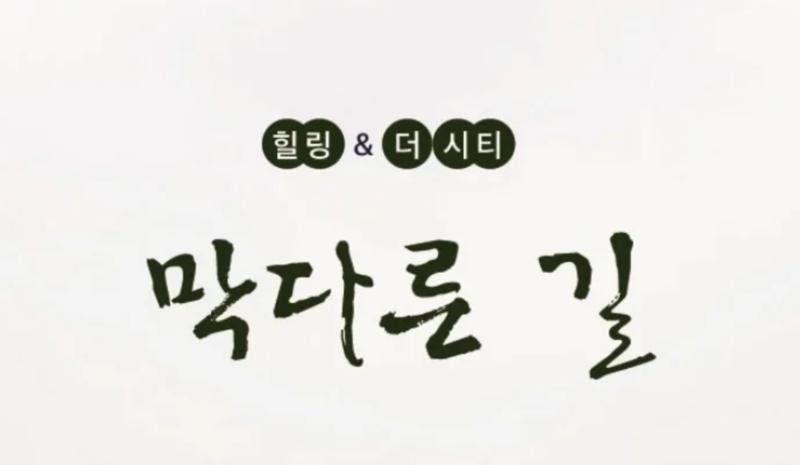 [비긴어게인] 칼럼 [힐링 & 더 시티] 막다른 길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낮선 동네라 어디가 어딘지 몰라 허둥대고 처음 가본 외국이라 지도를 손에 쥔 채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상하좌우를 살피느라 다리가 꼬여 휘청대다 발목이 삐끗할 때도 있습니다. 골목골목 꼼꼼히 뒤지는 피로가 쌓이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조급한 마음을 따라 눈도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지름길, 편한 ...
[비긴어게인] 칼럼 [힐링 & 더 시티] 막다른 길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낮선 동네라 어디가 어딘지 몰라 허둥대고 처음 가본 외국이라 지도를 손에 쥔 채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상하좌우를 살피느라 다리가 꼬여 휘청대다 발목이 삐끗할 때도 있습니다. 골목골목 꼼꼼히 뒤지는 피로가 쌓이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조급한 마음을 따라 눈도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지름길, 편한 ...

 KOWIN 미니 콘서트
KOWIN 미니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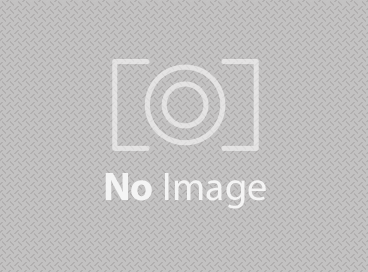 [홍콩총영사관] 대한민국 입국 방역정책 정보 (2023. 3. 11. 현재)
[홍콩총영사관] 대한민국 입국 방역정책 정보 (2023. 3. 11. 현재)
 [서라벌 침사추이] Happy Mother's Day & Happy Father's Day
[서라벌 침사추이] Happy Mother's Day & Happy Father's Day
 [월간지 WEHONG] 2024년 5월호
[월간지 WEHONG] 2024년 5월호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