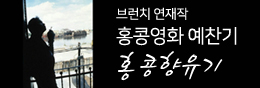로사 권
대청마루에 넋 놓고 앉은 노인의 깡마른 몸속으로 스산한 바람이 파고들어 뼈를 시리게 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뒤 그나마 있던 논밭과 조상이 묻힌 선산도 자식들이 사업자금으로 다 털어간 까닭에 남아난 게 없다. 다 쓰러져가는 이 집과 작은 텃밭이 노인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재산 전부다.
이들 부부도 지훈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승승가도를 달릴 때는 그나마 살림이 풍요로웠다.
서울에서 제일 비싸다는 강남에 아담한 집도 한 채 있었고, 멋진 차도 있었다.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 때 지훈의 검은 차를 타고 고향에 나타나면 모두들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었다.
그런데 지훈이 몇 년 지나지 않아 해외 무역 일을 하면서 만난 홍콩 사람들과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본가 노인들을 설득시켜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과 은행 대출금, 그동안 모아둔 비자금을 다 합쳐 홍콩에 사업장을 열었다. 처음에는 잘되던 사업체가 몇 년 지나지 않아 사기꾼의 손에 휘둘리는 바람에 부도가 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을 수습하느라 서울에 있는 집과 차도 다 처분했다. 홍콩에서도 빅토리아 하버가 그림같이 내려다보이는 미들레벨의 아파트에서도 쫓겨나 숨쉬기도 힘들 만큼 비좁고 토굴같이 어두운 아파트로 숨어들었다. 쥐새끼 같이 숨어있다고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느냐며 온 몸 가득 문신을 한 폭력배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목숨 값을 흥정했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 바퀴벌레가 우굴 대는 빈민가를 전전하며 죄인처럼 숨어사는 신세로 전락하자 그 충격으로 연희가 쓰러졌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가진 뱃속의 아이마저 잃은 연희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다. 이제 태동이 느껴진다며, 지훈씨 닮은 이쁜 딸을 낳아주겠다며 복사꽃 같이 활짝 웃던 연희였다.
죽을 끓여 방으로 들어오는 지훈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노인이 혀를 끌끌 차며 혼잣말을 하다 먼 산으로 고개를 돌린다. 딸을 산송장으로 만들어 내려온 지훈을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노인이다.
방에서 죽 그릇을 들고 나온 지훈이 이번에는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들고 들어와 젖은 수건으로 연희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준다. 비쩍 말라버린 가슴과 등가죽에 달라붙은 배를 깨끗이 닦아낸 후 몸을 돌려 등줄기를 닦아낸다. 지훈은 쥐어짠 빨래 마냥 비틀어져 있는 연희의 얼굴을 정성스레 만지며 "당신은 지금도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처럼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연희의 귀에 속삭인다.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던 연희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스친 듯 했다.
지훈이 연희를 만난 건 대학에 막 입학했을 무렵 책을 빌리기 위해 찾아갔던 학생도서관에서였다. 빼곡히 쌓인 책들 사이에서 환한 겨자색 원피스를 입고 새초롬하게 앉아있던 연희를 발견한 지훈이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는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청혼을 해왔다.
연희가 꿈을 이루기도 전에 날개를 꺾어버린 미안함과 어려운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준 고마움으로 물질적으로나마 부족함 없이 채워주려 무던히 노력했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홍콩에 연희를 데려다 놓고서도 지훈은 늘 바빴다. 바쁜 만큼, 그녀에게 소홀히 하는 만큼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게 해주면서 마음에 위안을 삼았었다. 텅빈 아파트에 덩그마니 혼자 남아 지훈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연희였다. 지훈을 따라 생전 처음 해외생활을 하게 된 연희는 낯선 환경과 습하고 더운 기후로 한 참을 앓았었다. 이후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대학 동창들과 선배들을 종종 만나는 듯 했다. 홍콩에서 소위 상류사회에 살며 남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그들과 만나고 나면 마음이 많이 부대낀다고 했다. 결국 다시 혼자 지내면서 요즘 부쩍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연희에게 지훈은 이국에 살면서 생기는 생긴 향수병이니 조금만 참으라고 다독거렸었다. 바쁜 사업일로 집에 돌아올 틈 없이 정신없이 지내느라 여리디 여린 그녀에게 마음 한 번 제대로 써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이국땅에서 그림자처럼 외롭게 살게 했던 것이 죄스러웠다.
지훈의 눈동자가 벌겋게 충혈이 되었다. 지난날의 잘못을 만회라도 하고 싶은 듯 정성스럽게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닦아낸다. 이렇게라도 해서 같은 가시덤불 같이 고통스러웠던 세월의 를 벗겨내고 싶다는 듯.
마당가득을 가득 채우던 어둠이 방문을 비집고 들어왔다. 해가 떠난 축축한 자리는 시퍼런 달그림자가 차고앉았다. 대청마루 아래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서럽다.
“여보,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 오듯 당신도 곧 일어날 것이야. 내 말 알아듣지?”
지훈은 늦가을 마른 넝쿨처럼 비득비득 말라버린 연희의 몸을 부둥켜안고 하루가 고단했는지 까무룩 잠들었다.
참새와 제비들이 아침을 여느라 빨랫줄에서 짹짹거린다.
허리 구부정한 노인이 부엌에 똬리를 깔고 쭈그리고 앉아 군불을 지핀다. 잘 마른 장작이 활활 잘 타고 있는데도 쓸데없이 툭툭 건드리자 불꽃이 튄다. 노인은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렸다가 한참 후에 뗀다. 매캐한 연기에 눈이 쓰라린 까닭이다. 원인 모를 눈물이 샌다.
서방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들을 낳아 기르며 평생 이렇게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깨어보니 서방님은 떠나고, 몸뚱이는 늙어 비들거리고 있는데 금지옥엽 키운 막내딸 연희는 산송장으로 돌아와 죽을 날만 기다리며 누워 있다. 불쏘시개 같은 껍데기만이 남아 군불을 지피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서럽다.
노인은 뒷마당에 놓여 있는 장독대로 가서 누런 된장 몇 숟가락을 사발에 푼다.
맑은 가을 햇빛에 눈이 부시다. 뒷산 구릉을 타고 내려온 솔바람이 노인네의 코끝으로 전해진다.
지훈은 시퍼렇게 구멍 뚫린 가을하늘을 바라보며 가을바람까지 살랑살랑 불어주니 더없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다. 연희가 좋아하는 날이다. 산산한 가을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받으라고 연희가 누워있는 방문을 활짝 열었다. 연희의 희고 싸늘한 얼굴위로 햇볕이 내리쬐었다. 방안 가득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다. 눈이라도 슴벅대던 연희에게 아무 기척도 없다. 연희의 얼굴을 만져본다. 마른 장작 같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훈이 벌겋게 충혈이 된 눈으로 쓰러질 듯 걸어 나온다.
노인이 사내의 표정을 보더니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만다.
“어머니…, 연희가 결국 갔습니다. 끄윽, 끄윽.”
아내를 잃은 지훈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허공 속에 메아리친다.
연희는 고난의 시간을 견뎌온 영혼을 내려놓고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태어나 처음 안긴 그 순간처럼 어머니의 가슴에 푸근히 안겨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무성하게 자란 억새가 사이로 보이는 강물이 바라본다. 팔십년이 넘게 보아온 강물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평화롭게 흐르고 있다.
노인은 흐르는 강물처럼 굽이진 삶을 살아온 자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걸 안다.
연희를 품에 안은 노인의 얼굴에도 따사로운 평화가 깃든다.
<끝>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모닝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28일 (토)
[모닝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28일 (토)
 홍콩한국국제학교 사회강사(시간제) 채용공고
홍콩한국국제학교 사회강사(시간제) 채용공고
 홍콩한인여성회 연말맞이 여성회 협력사 할인행사
홍콩한인여성회 연말맞이 여성회 협력사 할인행사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