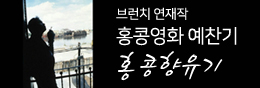이유성
햇살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늦은 가을저녁, 추수가 다 끝난 황량한 들판에 막 기울기 시작하는 해는 막바지의 햇살을 아낌없이 내뿜고 있다. 벼가 모두 다 잘려 나가고, 밑둥아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곳에 햇살이 채우고 있다. 멀리 보이는 나지막한 산등성이위에도 저녁놀이 빨갛게 내려앉는다. 저녁놀의 무게 때문인지 순애는 구부린 등을 펴고, 먼 산을 바라본다. 가느다랗게 뜬 눈은 저물어가는 서쪽에 있다. '그래, 저 해는 오늘 지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내일아침에 다시 뜨기 위해서 그 말간 얼굴을 잠시 감추고 있는 것뿐이지' 순애는 혼자서 중얼거린다. 자신에게 주는 용기와 격려의 혼잣말 인 것이다. 어제도 그제도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순애는 이삭줍기를 하고 있다. 흙 때가 낀 짧은 손톱으로 그녀는 땅에 떨어진 퍽퍽한 작은 알갱이들을 찾고 있다. 여러 날 반복된 같은 장소에서의 이삭줍기이기에 발견하지 못한 이삭들이 혹여나 있을까하는 기대감으로 들판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플라스틱바가지에 몇 알 안 되는 이삭들이 새초롬이 놓여있다. 그녀의 낡은 슬리퍼는 비가 온 뒤의 질퍽한 땅에서 그녀를 더욱 피곤하게 한다.
"어이, 영철엄마, 오늘도 이삭 줍는기가? 순복이네서 삯바느질감 준다 카든데, 일감이 없는 갑재?" 시장에 다녀오던 이웃집 아낙네는 시장에서 잔뜩 산 물건들을 머리위에서 들썩이며 마치 자랑하는 듯하다. 그녀의 허리춤에서 짚에 묶인 채 달랑거리는 자반고등어가 순애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아닙니더. 그냥 심심해서 나왔심더, 댕겨 가이소" 순애는 멋 적은 듯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말없이 허리를 굽힌다. 굽힌 등 뒤로 아낙네는 다시 묻는다. "영철이 아부지한테서는 아무 소식이 없는 갑재?"
포목점을 하던 남편 병만은, 어느 해 홍수에 의해 창고의 모든 직물들이 썩어져버려,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 후, 병만이는 빚 독촉에 못 이겨 집을 나간 지 3년이 흘렀다. 이 세월이 순애를 들판으로 몬 것이다. 순애는 아낙네의 물음에 아무 대답 없이 허리를 구부려 발가락사이로 삐죽이 올라온 흙더미를 귀찮은 듯이 바라본다. 뒤로 동여맨 머리칼 속에서 빠져 나온 몇 가닥들이 순애의 목 줄기를 타고 내려온다. 순애는 눈물을 가리기 위해 허리를 더 굽히고 머리카락들을 얼굴 쪽으로 민다. 해가 거의 넘어간 들판은 어둑어둑해지고 있다. 바쁜 걸음으로 이리저리 두리 번 거리는 순애 뒤에서 낯 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어무이, 왜 거기 서있습니꺼?" 그녀의 아들 영철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아이고, 내 아들 영철이 아이가. 엄마가 니를 기다렸다카이. 배고프재, 퍼뜩 집에 가자, 저녁 해주꾸마" 순애는 질퍽한 바닥을 종종 걸음으로 논밭을 빠져 나온다.
보자기 책가방을 허리춤에 질근 맨 영철이는 그러한 엄마를 바라보면서 코끝이 찡해 오는 것을 느낀다. "어무이요, 이제 그만 들판에 나오지 않으면 안됩니꺼, 내사마, 친구들한테 챙피해합니더" 영철이는 그렁한 눈을 엄마에게 들킬까 싶어 몇 발짝 앞으로 걸으며 말한다. 엄마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고 싶었지만 퉁명스러운 타박으로 대신한 것을 순애는 알고 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플라스틱바가지에 담겨있는 이삭들을 꺼내어 지푸라기를 골라낸다. 알갱이들은 이리저리 뒹굴다 데구르르 땅에 떨어지는 낱알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순애는 손가락을 오무려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주워 다시 채에 올려놓는다.
"어무이, 아직도 저녁 멀었습니꺼, 배고파 죽습니더" "오야오야, 이제 다 됐다, 조금만 기다리거래이" 순애의 손길이 더욱더 바쁘게 절구통에 넣고 방아를 찧는다. 말린 시래기와 함께 끓인 죽을 아들 영철에게 내민다.
"우리아들, 오늘도 수고 했재, 마이 묵으라" "어무이, 왜 한 그릇뿐 인교, 어무이는 안묵습니꺼?" "내는 아까 낮에 실컷 먹었다 아이가, 어무이 걱정 말고 니 많이 묵으라" 순애는 애써 웃으며 영철의 등을 두드리면서 말한다. "영철아 어무이는 삼일예배에 댕겨 올끼다. 숙제하고 있거래이" "알겠심더, 후딱 댕겨오이소"
순애는 빨간 가죽 성경을 손에 들고 교회로 향한다. 교회로 가는 길은 고달팠던 들판을 지나가야 한다. 성경책을 두 손으로 가슴에 묻고 어둑해진 들판을 바라보면서 걷는다. 깜깜해진 들판은 마치 바다 같아 보인다. 저 쪽 어디선가, 몇 년 동안 소식 없던 남편이 걸어오고 있지나 않는지 조심스레 살핀다. 손에 쥔 성경책을 더 꼭 안으면서...
작은 예배당의 문 앞에는 접시꽃과 싸리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어두웠지만 순애는 그들의 인사와 미소를 느끼는 것처럼 정겹다. 예배당에 들어서니 옆집 할머니와 몇몇들이 일찍 와서, 방석도 없는 바닥에 앉아 예배준비 기도를 하고 있다. 순애는 교회 안을 들어서자마다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쉰다. 머나먼 피곤한 여정을 끝내고 고향집에 들어 온 것 같은 평안이 순애를 맞아 준다. 두 번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눈을 감자마자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
순애는 자신의 비참함을 기도하기 시작한다. '주님, 제가 언제 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남의 삯바느질과 이삭줍기로 살아하는 하는 겁니까, 감사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애는 복받침과 원망함으로 기도한다, 세상에서 자기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애는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낸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께서 다가와 묻는다. "집사님,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들판에서 집사님이 희망을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꺼?"
순애는 의아한 듯이 목사님에게 물었다. "집사님이 한 톨 한 톨 찾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집사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버려진 이삭도 집사님이 주어서 양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집사님은 희망을 주우신 것입니다. 착하고 듬직한 영철이가 있지 않으십니까, 영철이 아버님은 꼭 돌아오실 겁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요" 순애는 목사님의 위로의 말에 남편을 믿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그래 맞아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거야 나의 소중한 아들 영철이도 있잖아. 비록 한 끼, 한 끼 걱정하면서 살고 있지만, 여지 껏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집으로 향한다.
영철이는 숙제를 하다 공책에 엎드린 채 잠이 들어있다. 나지막한 화장대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잠든 영철이를 깨운다. "영철아, 세수하고 자야재, 퍼뜩 인나거라" 영철이는 눈을 비비고 졸린 눈으로 방문을 연다.
10월말의 기분 좋게 차가운 바람이 방안을 메운다. 세수를 마치고 돌아온 영철이는 "어무이, 내 다시 배고프요, 쌀밥하고 고깃국 실컷 먹고 싶으요, 그라고, 내일모레는 학교에서 가을소풍 간다케요" 순애는 배고파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저려온다. "조금만 기다리거래이, 아버지가 돌아오실끼다, 우리아들 조금만 참거래이" 순애는 배고파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달랜다. 배고파 억지로 잠든 영철의 옆에서 순애는 바느질바구니를 꺼낸다. 딸의 결혼식을 위한 한복을 만들어 달라는 이웃이 삯바느질을 하기위해서이다. 순애는 촛불 앞으로 바짝 들여 앉는다. 옥 색깔의 치마폭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곱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순애의 눈은 피곤함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영철의 소풍날을 위한 도시락을 싸 줄 일이 걱정이다. 쌀독 뚜껑을 열어보니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항아리는 마치 순애의 텅 빈 가슴과도 같다. 다행히 옆집에서 갖다 준 감자 몇 알을 삶아 영철의 소풍보자기에 담아 주고는 순애는 서러움에 목 놓아 운다.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어미의 마음은 겨울에 내던져진 희나리 같단 생각을 한다. 그날, 소풍에서 돌아온 영철이는 풀이 죽어있다. 고개 숙여 얼굴을 아래로 내려뜨린 영철에게 다가가 묻는다. "무신일이 있었노, 와 그라는데?" 순애는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며 묻는다. 영철이의 속상함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준식이는 김밥하고 찐 계란 싸왔음더, 내는 챙피해서 도시락도 못꺼냈다 아입니꺼"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삶의 지침이 순애를 다시 원망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
며칠이 지난 후, 순애는 가을 저녁 들판에 다시 서있다. 이삭을 줍기 위해서가 아니고 희망을 줍기 위해서이다. 불어오는 바람은 겨울 호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빛냄새처럼 상큼하다. 서쪽으로 기울고 있는 해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먼 산들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순애는 생각한다. '지금은 비록 주인에게 버려진 쓸모없는 이삭들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한 끼가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멍하니 들판을 바라보는 순애에게 지나가던 쌍둥이 엄마가 물었다. "영철어무이, 아직도 이삭들이 남아 있는교? 순애는 자신 있게 대답한다. "아니라예, 저는 이삭을 줍는 게 아이고, 희망을 줍고 있다 아입니꺼" "뭐라꼬? 그게 무신 말이고, 뭐라 카는기요?" 순애의 알아듣지 못하는 대답에 이웃 아낙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멀어져 간다.
잠시 후, 또 다른 이웃아낙네가 헐레벌떡 순애 쪽으로 뛰어 오고 있다. "영철어무이, 후딱 청내리 시장통을 빨리 가보소" "와예, 무슨 일이 있는교?" 순애는 불안한 듯 물었다. "내조카가 영철아부지를 그 시장에서 봤다 카드라, 어떤 젊은 여자하고 있다 카는데, 에고 우짜믄 좋노" 순애는 노란 현기증이 올랐지만, 담담한 척 대답한다. "아니라예, 그 사람은 우리 영철아바이가 아니라예, 우리 영철아바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예. 잘못 봤을 겁니더" "에구, 참말로.. 그렇게 고생 하믄서 그런 말이 나오는 기요, 몇 년 동안 연락도 안하는 사람을~ 쯧쯧~~ 이웃 아낙은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사라져간다.
/ 다음호에 계속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30일 (금)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30일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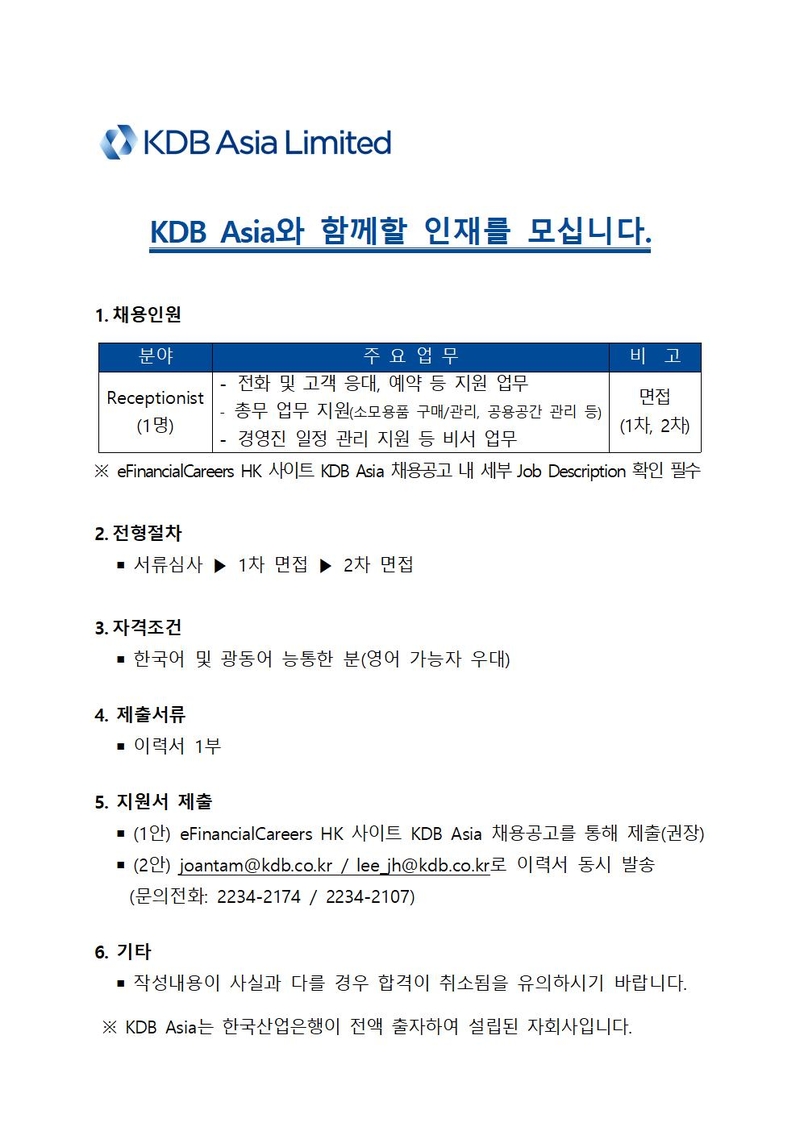 KDB Asia 와 함께할 인재를 모십니다.
KDB Asia 와 함께할 인재를 모십니다.
 [성정하상 바오로 홍콩한인성당] - "함께하는 기쁨"
[성정하상 바오로 홍콩한인성당] - "함께하는 기쁨"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